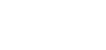양동규 개인전
페이지 정보

본문
전시회 설명
‘희고 흰 바람’이라는 제목은 이중적인 언어의 층위에서 출발한다. ‘희다’는 맑고 옅은 상태, 즉 투명하고 흐릿한 결을 품고 있으며, ‘흰’은 채워진 색으로서 완결된 상태, 백색의 응집을 상기시킨다. ‘희고 흰 바람’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색이 아니라, 존재와 비존재, 현재까지 오는 감각과 드러난 감정, 그리고 사라짐과 잔존 사이를 부유하는 정동(情動)의 층을 상정한다. 이 전시는 정감 이전의, 감정이 형성되기 전의 열림 — 몸이 먼저 느끼고 반응하는 감응의 장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 전시는 제주라는 장소, 그중에서도 4.3의 시간을 품은 특정 공간에서 출발한다. 그곳은 기억되지 못한 존재들이 거주했을 수도, 죽어갔던 장소일수 있으며, 지금은 흔적만이 남아 있는 곳이다. 혹은 타인을 뒤 남겨진 자여서 생존을 위한 여로였을 수도 있다. 반복되는 파도와 바람, 이내는 다시 그 위에 진동이 생을 뒤덮다. 바람은 모든 것을 지나가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듯하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흔든다. 바람에 의한 진동은 생의 반응이며, 이들은 모두 작가가 직접 체험하고 만유한 사유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장소의 정념과 마음을 모은 집합이며, 동시에 정동의 매개체이다.
정동이란, 철학적 개념으로 보자면 감정 이전의 신체적 반응이며, 언어 이전의 감응 상태다. 이는 하이데거가 말한 ‘거주’의 본질 — 즉, 장소의 존재론적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장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시간과 존재, 감정과 기억이 축적된 생의 저장소이다. 이 전시는 그러한 장소에서 ‘흰’을 끌어내고자 한다. ‘흰’은 단지 색채적 개념이 아니라, 사물에 스며들어 있는 정서의 밀도이며, 감각의 진동이다. 작가는 이를 직접적인 재현이 아닌, 체험된 사물들의 배열과 그것을 만든 제작, 조각의 구조, 평면적 공기의 진동 등을 통해 감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이 전시에서 중요한 개념은 ‘동정정치’다. 말하지 않고도 감응케 하는 힘, 그리고 감응을 통해 서로를 출발시키는 정치적 장치. 이는 역원의 기억과 비가시화된 고통이 언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를 거쳐 관객에게 이르는 과정이다. 숯, 돌, 어깨는 단순한 오브제가 아니라, 저마다의 재료에 얽힌 우세를 품고 있으며, 이들이 진동이 전해지는 순간, 그 공간은 다시 이전의 시간과 정서와 살아 있는 존재들로 떠오르게 된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감응은 그것을 기억한다. 그 느낌은 정감으로 전이되고, 감정의 정치가 발생한다.
‘아름다움’이라는 개념도 이 전시에서는 새롭게 사유된다. 이는 시각적 조형성이나 조화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고요함 속에서, 존재가 지녔던 감정, 잊혀진 감응을 통해 드러나는 정서적 깊이의 문제다. 그것은 ‘서정적 아름다움’, ‘위로의 아름다움’, ‘존재로서 아름다움’ 혹은 ‘무상의 아름다움’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은 애도하면서도 생의 존재를 다정하게 감싸 안는 데서, 비로소 그 감각이 이 전시가 지향하는 핵심이다.
‘희고 흰 바람’은 말하자면, 완전히 사라진 것도, 명확히 존재하는 것도 아닌 어떤 흐름이다. 그것은 비물질이지만 감각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이 전시는 작고 평범한 사물들 — 숯, 돌, 어깨 — 을 통해, 기억의 정동, 감응의 흔적이, 공기지고, 타백지고,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음을. 작가는 그 진동의 삶, 멈없이 남겨진 존재 속에서 관객의 정서를 환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고요하지만 정제된 정치적 사유이며, 정념 속에서 가장 생생히 발화되는 감응의 순간이다.
이 전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처럼 지나가며 감응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감정이 되고, 기억이 되고, 다시 시간 속에 휘발된다. 남는 것은 다시, 희고 흰 바람이다.